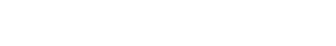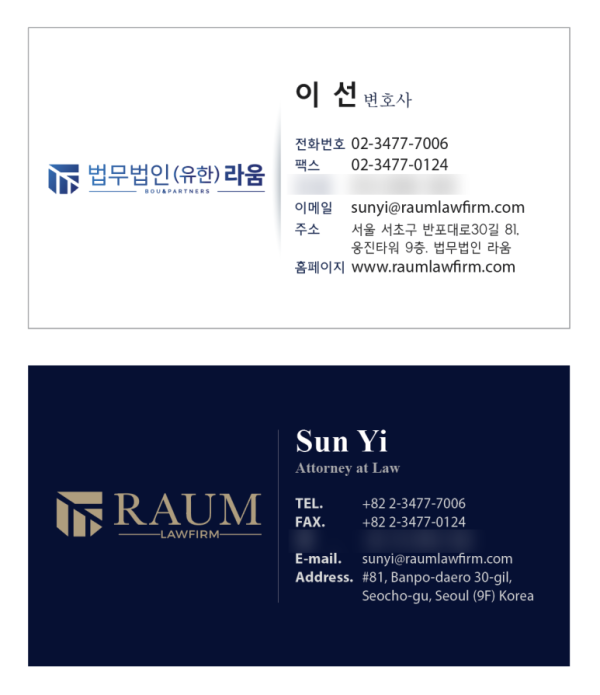[이선 변호사] 국제상속 어떤 법이 적용되나?
페이지 정보

본문
상담사례미국국적을 가진 A가 사망하였습니다.A는 B와 C 자녀가 둘(2)이 있습니다.B의 국적은 미국이고, C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A는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여러채 있어,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입니다.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는 것일까요? 한국법을 따르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첫 단계이면서도 아직까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아는 분이 없을 정도로 생소한 영역입니다.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준거법을 각 나라의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후에 미국인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고 B도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제77조에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7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그런데,
만약 2중 국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16조(본국법)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2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더 밀접한 국가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A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본국법은 미국법과 한국법이 되고,
이 중 한국법이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되는 것입니다.
B와 C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은 각각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준거법이기 때문에, B와 C가 국적이 달라도 적용되는 법은 모두 한국법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B와 C의 국적이 아니라, A의 본국법입니다.
그런데 A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는 유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의 일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77조(상속)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따라서, 상속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통해 그 준거법을 지정하여 미리 Estate Planning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77조 2항 제1호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으나,
일상거소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매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포분들의 경우에는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속에 대해 여러면에서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자산이 있으신 경우라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족들이 당황할 수 있고,
당항으로 인해 현명한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하고,
가족의 재산의 상당수를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Estate Planing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 properties별로 준거법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이 준거법이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준거법을 보면,
간혹 반정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반정이라는 것은, 그 법에 "그러나 00000한 경우에는 A나라 법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용을 다른 나라법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반정을 위한 반정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법으로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를 주거소지로 두고 있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
준거법은, 미국법, 그 중 캘리포니아법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법을 보면, 부동산상속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물론 유언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준거법을 일단 정확히 확인해 보고 나서
그 절차는 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곳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등기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사 미국법에 따라 부도산의 상속을 A에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한국의 등기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더 궁금하신 점은,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십시오.
관련링크
- 이전글[이선 변호사] 기업소송과 이혼소송 24.02.20
- 다음글[임영근 변호사] 매매목적물이 가압류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24.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